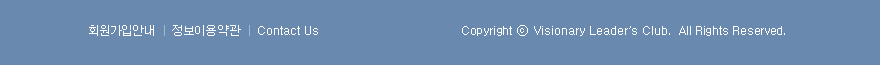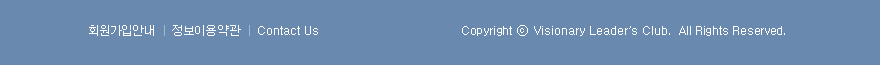놀고 먹으며 사는 존재로, 산촌을 즐기며 사니 고마움이 넘칩니다.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사니 삶이 가쁜합니다.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로 마음 먹고 살다보니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유한 것이 없으니 몸이 가벼워 산촌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자연이 베풀고, 나비가 꽃에서 얻어 먹듯이 산촌의 사람들에게서 얻어 먹으면서 또 고마움이 넘칩니다.
그런 나는 산촌 농군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네들은 이미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늙기 시작했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김치를 해서 날라야 된다고 여기는게 여전합니다. 고추를 장만해서 보내야 하고, 곡식을 보내야 하고 등의 생각은 젊어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네들은 자신을 혹사하며, 아프다고 외치며 일을 합니다. 그런 그들은 돈을 쓸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돈을 써보지 못해서 어디에다 써야 하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간혹 어울려 식사를 해도 밥값내기를 싫어하며 한 번 쥔 주먹은 펼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노인네들은 모두 넉넉한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부자입니다. 어쩌다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식비를 내면서 부자임을 느끼며 그런 여유가 있음에 고맙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국민연금이 정해진 날에 정확히 들어오니 그에 맞추어서 부자로 삽니다. 서울이 아니기에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버스비는 한 달에 몇 천원 씁니다. 아직도 건강한 다리가 나의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내가 내는 밥값은 또다른 식품을 내게 물어다 줍니다. 다음 기회의 밥을 얻어먹게 합니다. 이러니 서로 '고맙습니다'를 하게 되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 농군들은 너무 바빠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했으나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면사무소 소재지인 곳에 있는 단골식당을 중심으로 그런 흐름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혼자 먹는 밥, 그것도 제대로 하는 식사는 점심 한 끼입니다. 그런 식사를 위해서 음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게으른 나는 움직거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얻어 먹어야 한다고 여겼고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양념 등을 거의 장만하지 않고 삽니다. 지난 봄에 식당에서 고춧가루 한 숟가락 얻어온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근처 절에서 얻어 옵니다. 김장김치는 여기저기에서 얻어집니다.
이런 나는 노인네들이 많은 음식과 식품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못먹으면 버려질테니 이도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 여겨지기에. 나라도 얻어 먹으면서 그 양을 덜어주는 것이 지구의 건강에 협조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먼저 얻어먹고, 적당한 기회에 보답을 하고, 그러다 나눔의 흐름이 형성되고, 그 흐름을 타고 긍정의 기운과 정이 흐른다고 여깁니다. 웃음도 그 흐름에 올라 타고 그런거라고 봅니다. 힘을 주어 주먹을 꽉 쥐고 사는 것 보다 힘을 빼고 주먹을 좌악 펴고 사는 것이 편안한 삶이라 여깁니다.
도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유의 일변도를 벗어나고, 자신의 필요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적당한 돈벌이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꼭 도시에 몰려 사는 것, 좋다는 스펙, 그런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벗어난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 점에 모여서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에게 맞는 공간에서 저마다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함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늙어서도, 힘들다면서도, 아프다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설정을 벗어던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얻어 먹으면서 사니 삶과 세상이 기쁨으로 답을 줍니다.
visionary 이화순 lhs@visionary.co.kr
|